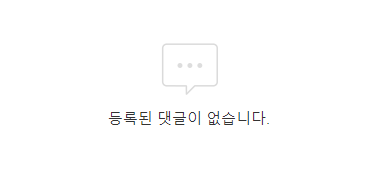|
||||
|
|
자유토크 |
||||||
|
기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의 유래 와우 | 2011.03.22 | 조회 10,770 | 추천 131 댓글 0 |
||||||
기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의 유래 국어학자인 김교수가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참 으로 대단한 수확이었다. 그날 김교수는 습관처럼 뭐 좀 건질 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혼자서 뚜벅뚜벅 시골길을 걷고 있 었는데, 때는 4월초라 들판에는 못자리 판에 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그 때, 한 노인이 괭이를 둘러메고 못자리 판을 둘러보다가 넋두리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원, 쯧쯧! 또 기신이 씨나락을 반이나 까무웃구만!" 김교수는 귀가 번쩍 띄었다. 귀신, 씨나락…. 오랫동안 그 말의 어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애를 써 왔 는데, 드디어 오늘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김 교수는 급히 그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저, 영감님! 방금 영감님께서 귀신이 씨나락을 반이나 까먹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 인지요?" 그러자 그 노인이 김교수를 흘끔 쳐다보더니 내뱉듯 말했다. "아, 이걸 보고도 묻능기요? 못자리판에 뿌린 씨나락 싹이 반도 안 텃다 아잉기요. 이기 바로 기신이 씨나락을 까무운 기 아이고 머겠능기요?" 김교수는 더욱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그러면 저,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 그렇다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일 딴딴한 놈으로만 골라 뿌린 뱁씨가 와 싹이 안 텄겠소?" 김교수는 옳다구나 싶어 가슴이 마구 뛰었다. "저, 영감님. 어쩌면 이 말의 뜻도 알고 계실 듯한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유래된 말일까요?" "허허! 그 말……." 그러더니 노인은 김교수를 빤히 바라보며 묻는다. "그란데 도대체 당신은 누군교?" "아, 네. 저는……." 김교수는 허리를 굽혀 정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는, 노인에게 담배 한대를 권했다. "모든 말에는 다 어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새 뒤비지 날아가는 소리', '낙동강 오리알'… 뭐 이런 말에도 다 그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이나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학자로서 그런 말이 생 성되게 된 어원을 밝혀보고자 하 는 것입니다." "허허, 그렇다면 당신 오늘 제대로 찾아 왔구먼. 그 말이 어떠케 생깃는고 하니……." 노인은 담배를 한 입 빨아서, 후-하고 연기를 허공으로 내뱉고는 말을 이어 나갔다. "여 사람들은 모다 다 아는 이바구지."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러했다. 예로부터 농사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씨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자씨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 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나락을 삶아 먹지는 않는다. 씨나락을 없앤다는 것은 희망을 버린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가장 충실한 놈으로 먼저 씨나락을 담아 놓고, 남 는 것을 양식으로 쓴다. 그리고 겨울을 지낸 후 새봄에 그 씨나락을 못자리 판에 뿌리는데, 그렇게 충실한 씨앗으로 뿌렸건만 발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이 씨 나락을 까먹었기 때문' 이라고 하고, 귀신이 까먹은 씨나락은 보기에는 충실하게 보여도 못자리판 에 뿌렸을 때 싹이 나지 않는단다. "이놈의 기신, 또 씨나락을 까묵기만 해 바라." 지난해에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는 바람에 모의 발아가 반도 안 되어서 농사를 망친 박노인은, 신경 이 몹시 곤두서 있었다.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지 못하게 하여,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다. 씨나락은 지금 헛방의 독에 담겨져 있다. 밤잠이 별로 없는 박노인은 온 밤 내내 헛방 쪽으로 신경 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뽀시락'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기 무슨 소리고? 틀림없이 기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재?" "참 내, 아이그마는, 깨내기 소리 아이요. 신경쓰지 말고 주무시소 고마." 선잠을 깬 할멈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는 듯 짜증스럽게 말하자, 박영감이 화를 버럭 내었다. "멍청한 할망구 같으니라구. 그래 이 판국에 잘도 잠이 오겠다." 할멈에게 타박을 준 박영감은, 헛방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어 젖히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놈의 기신아! 내가 네 놈의 짓인 줄을 모를 줄 아나? 내 다 알고 있서이 썩 물러가거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와진 박영감은 이제 바람이 문짝을 조금만 건드려도 큰기침을 하며 달려나가, 온 집안을 돌며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이놈의 기신이 어데를 들어올라꼬 문고리를 잡고 흔드노? 썩 물러가라, 썩! 썩! 이놈의 씨나락 기 신아!" 야밤중에 갑자기 질러대는 고함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깜짝 놀라 깨어 가지고는 모두 밖으 로 달려나갔다. 어른이 엄동설한 한밤중에 바깥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데 어떻게 아 랫사람이 뜨뜻한 구들목에 그대로 누워있을 것인가. 온 식구가 다 나가서 박영감의 노기가 가라앉 을 때까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는 들어오게 되는데, 천리 만리로 달아난 잠을 내일을 위해 억지 로 청해서 설핏 잠이 들려고 하면 또 바깥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만식아! 봉길아! 퍼떡 나와 보그레이. 이놈의 기신이 또 씨나락을 까묵으러 왔는갑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날은 하루 저녁에도 두 세 번 씩 오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자, 온 집안 식구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일로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영감, 잠 좀 잡시더. 꼭 기신이 씨나락을 까묵는다 카는 징거도 엄는기고, 또 기신이 씨나락을 까 묵을라꼬 마음 무마 그런다꼬 몬 까묵겠소? 지발 아아들 그만 뽀그소. 그 아아들 내일 일 나갈 아 아들 아이요?" 보다못한 할멈이 영감을 붙들고 사정을 해 보지만, 박영감의 고집을 누가 꺾으랴! "이 할망구야, 우찌 눈을 버히 뜨고 기신이 씨나락을 뽀시락뽀시락 다 까묵는 거를 보고만 있으라 말이가? 기신이 안 까묵으모 누가 까 묵었을끼라꼬?" 그 해 겨울 내내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거의 매일 밤잠을 설치다 보니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게 되어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쯤 되자, 아무리 효자로 소문 난 만식이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만식이는 기어이 아버지에게 대어들었다. "아부지, 지발 그 기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 좀 하지 마이소. 인자 고마 미치겠심니더."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김교수를 건네다 보았다. "어떴능기요? 그럴 듯 한기요?" 흥분된 김교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꾸벅 절을 했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허허! 머를, 그 정도 가지고. 이런 거를 보고 진짜 기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라 하는기라." * 이한영 선생 홈에서 복사/ 경상도말은 운영자가 약간 수정 하였음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