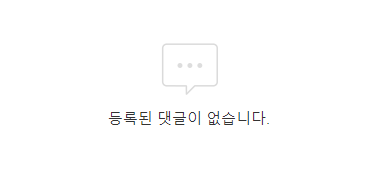혼차 고생 말고 항꾸네 허세
우리나라 축구를 볼라치면 늘 답답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발에 달고 다니듯 자유자재로 볼을 모는 남미나 유럽 선수들에 비해 드리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기가 떨어지니 상대를 돌파할 수 없고, 상대를 뚫고 골문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확률이 떨어지는 중거리 슛만 남발하게 된다.
마치 농구 경기에서 레이업에 의한 골밑슛을 하지 못하고 중거리 슛이나 삼 점 슛에 의존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 하겠다. 미국 프로농구에서도 대부분의 슛은 골 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상대 선수를 속이고 골 밑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들의 현란한 개인기 때문이다. 이처럼 축구나 농구, 모두 상대의 방어를 뚫고 슛을 날리는 개인기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게 이런 개인기가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이는 잔디구장에서 훈련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몸이 남미 선수들에 비해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문화적 특성이 여기에 관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만약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축구팀에서 어떤 선수가 개인기를 구사하여 상대팀을 돌파하려 했다고 하자. 성공했다면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돌파에 실패해서 공을 빼앗기게 되었다면, 그리고 결정적인 슛 찬스를 이렇게 해서 무산시켰다면? 장담컨대 경기가 끝난 뒤, 감독이나 선배 선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 틀림없다. '네가 뭔데 옆 사람한테 패스를 안 하고 혼자 공을 몰고 다니느냐?'와 같은 질책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 두 번 이런 꾸중을 듣게 되면, 다음 경기에서 누가 감히 상대 선수를 돌파할 생각을 하겠는가? 옆 선수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선배 선수에게 공을 패스해 놓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안심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런 문화적 특징 때문에 한국 축구는 개인기보다는 패스에 의한 조직 플레이를 주로 활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개인기의 기초가 없는 조직력이란 한계가 뻔한 법이다. 적어도 한 두 사람 정도는 쉽게 뚫을 수 있는 개인기를 갖출 때 비로소 공간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때에야 이른바 창조적인 축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축구나 농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의 곳곳에서 조직의 유대를 강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단합대회>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심심하면 단합대회라는 이름으로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갖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니, 이런 모임을 통해 느슨해진 조직의 체계를 다시금 세우거나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는 것이 그 목적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서양 사람들이 매일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해 대면서 부부나 연인간의 애정을 확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에서도 단합이나 조화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그런데 조직의 단합이란 궁극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개성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진 조약돌처럼 부딪치지 않게 되었을 때, 단합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개성을 중시하여 제멋대로 공을 드리볼해 가는 선수가 있다면, 그 조직은 이런 파괴적 개성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창조적 개성은 사라지고, 원만한 관계만을 강조하는 몰개성적 집단만이 남게 된다. 개인기 없는 선수들에게서 창조적 축구를 기대할 수 없듯이, 개성 없는 조직에서 독창적 활동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보다 집단과 조직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늘 '함께'라는 말을 강조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함께'라는 부사야말로 우리 문화의 조직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말인 셈이다.
'함께'는 전라도 말에서 '항꾸네'로 쓰이는데, '혼차 고생 말고 항꾸네 허세'와 같은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는 중세어에서 ' '로 나타난다. 『두시언해』에 보이는 '그려기와 '로 나타난다. 『두시언해』에 보이는 '그려기와  오리로다(雁同來)'는 '기러기와 함께 올 것이다'로 해석된다. ' 오리로다(雁同來)'는 '기러기와 함께 올 것이다'로 해석된다. ' '의 ' '의 ' '는 어원적으로 ' '는 어원적으로 ' '와 '의'가 결합된 것으로서, ' '와 '의'가 결합된 것으로서, ' '는 '때'를 뜻하던 옛말이고, '의'는 오늘날의 '에'와 같은 것이니, ' '는 '때'를 뜻하던 옛말이고, '의'는 오늘날의 '에'와 같은 것이니, ' '는 곧 '때에'를 뜻하던 말이다. 결국 ' '는 곧 '때에'를 뜻하던 말이다. 결국 ' '란 <한 때에>라는 뜻을 기원으로 가졌던 것이다. '함께'란 오늘날 <같이> 또는 <한 무리로>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원래는 <동일한 시기에>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란 <한 때에>라는 뜻을 기원으로 가졌던 것이다. '함께'란 오늘날 <같이> 또는 <한 무리로>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원래는 <동일한 시기에>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전라도말 '항꾸네'도 기원은 ' '와 같다. 우선 '항꾸네'는 '한꾸네'에서 동화된 것이니, '한꾸네'의 '한'은 ' '와 같다. 우선 '항꾸네'는 '한꾸네'에서 동화된 것이니, '한꾸네'의 '한'은 ' '의 ' '의 ' '이다. '꾸네'는 '꾼에'인데, 여기서 '에'는 처격 조사로서 옛말의 '의'에 대응한다. '에'가 결합된 '꾼'은 옛말 ' '이다. '꾸네'는 '꾼에'인데, 여기서 '에'는 처격 조사로서 옛말의 '의'에 대응한다. '에'가 결합된 '꾼'은 옛말 ' '와 같은 것이지만, 표준어와 달리 끝소리에 /ㄴ/이 덧붙었을 뿐이다. '와 같은 것이지만, 표준어와 달리 끝소리에 /ㄴ/이 덧붙었을 뿐이다.
이처럼 전라도말의 '항꾸네'와 표준어 '함께'는 기원이 같지만, /ㄴ/ 첨가라는 음운 현상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과는 매우 달라졌다. 사람들이 이 두 말의 관계를 알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






 '로 나타난다. 『두시언해』에 보이는 '그려기와
'로 나타난다. 『두시언해』에 보이는 '그려기와  '는 어원적으로 '
'는 어원적으로 ' '와 '의'가 결합된 것으로서, '
'와 '의'가 결합된 것으로서, ' '이다. '꾸네'는 '꾼에'인데, 여기서 '에'는 처격 조사로서 옛말의 '의'에 대응한다. '에'가 결합된 '꾼'은 옛말 '
'이다. '꾸네'는 '꾼에'인데, 여기서 '에'는 처격 조사로서 옛말의 '의'에 대응한다. '에'가 결합된 '꾼'은 옛말 '